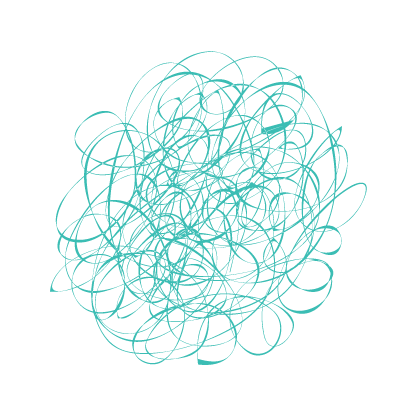"그런데 율포를 떠나기 전날이었나요. 자동차 문을 닫다가 아버지께서 그만 손가락을 다치셨습니다. 놀란 저는 아버지를 근처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서 소독을 하고 소염제 처방만 받아왔는데 온 식구가 많이 놀랐지요. 그런데 그때,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마치 온 가족을 대신해 아버지가 손을 다친 건 아닐까, 온 가족이 다칠 것들을 당신 혼자의 몸으로 다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을 대속한 듯 말입니다. 저의 지나친 감상이었을까요. 몇 년 전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을 때도 그동안 쌓인 저의 수많은 죄를 아버지가 대신 거두신 것 같다는 생각에 젖어들었었지요."
- 마종기 ∙ 루시드폴, <사이의 거리만큼, 그리운>
마종기 시인의 시를 모티브로 하였던 전시 하나를 보고 나서, 전시를 하신 작가분보다도 먼저 시를 쓴 시인이 궁금해졌다. 어쩌면 훨씬 많은 나이의 어른, 그가 쓴 글을 제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기는 할까, 의문이 먼저 들기도 했다. 찾아보니 마침 좋아하는 곡들을 많이 만들고 부르는 루시드폴이라는 음악가와 편지글을 주고 받은 기록이 있다고하기에, 마음 가볍게 펼쳐들고 담담해지고 싶을 때 읽고 있다. 대부분이 일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삶을 바라보는 의외의 태도나 관점을 발견할 때에는 그 계절에 처음으로 물든 은행잎이나 단풍잎을 볼 때처럼 잠깐 놀라게 된다.
'동네디자이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떠나기 전 마지막 입맞춤 / 대니 그레고리 / p.89 (0) | 2015.11.29 |
|---|---|
| 손님을 싫어함('그늘에 대하여' 중) / 다니자키 준이치로 / p.144 - p.145 , p.151 - p.153 (0) | 2015.11.28 |
| 여행 ('그늘에 대하여' 중) / 다니자키 준이치로 / p.168 (0) | 2015.11.28 |
| 그늘에 대하여 / 다니자키 준이치로 / p.67 (0) | 2015.11.27 |
| 그때 그 책을 읽었더라면 / 최범 / p.123 (0) | 201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