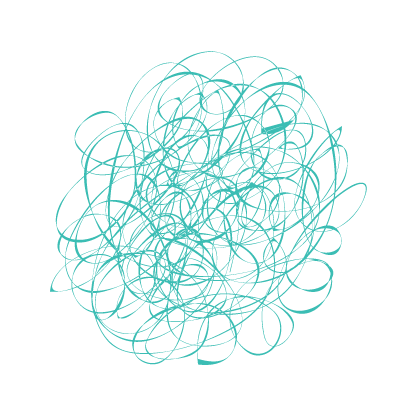첫 소설을 쓸 때 느꼈던, 문장을 만드는 일의 '기분 좋음' '즐거움'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데워 큼직한 머그잔에 따르고 그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이따금 원고지와 오래도록 애용해온 몽블랑 굵은 만년필이 그리워지지만). 그리고 '자, 이제부터 뭘 써볼까' 하고 생각을 굴립니다. 그때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써내는 것을 고통이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설이 안 써져서 고생했다는 경험도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내 생각에는, 만일 즐겁지 않다면 애초에 소설을 쓰는 의미 따위는 없습니다. 고역으로서 소설을 쓴다는 사고방식에 나는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소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퐁퐁 샘솟듯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무슨 천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삼십 년 넘게 전업 소설가로 밥을 먹고 있으니 전혀 재능이 없는 건 아니겠지요. 아마도 원래 어떤 종류의 자질, 혹은 개성적인 경향 같은 건 있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 내가 이러니저러니 궁리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은 다른 누군가에게 - 만일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지만 - 맡겨두면 될 일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가장 소중히 여겨온 것은(그리고 지금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는 어떤 특별한 힘에 의해 소설을 쓸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라는 솔직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그 기회를 붙잡았고, 또한 적지 않은 행운의 덕도 있어서 이렇게 소설가가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얘기지만,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어진 것입니다. 나로서는 일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그저 솔직히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격을 - 마치 상처 입은 비둘기를 지켜주듯이 - 소중히 지켜나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소설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일은 또 그다음 일입니다.
'동네디자이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몬스터 콜스 - 패트릭 네스 / 시본 도우드 / 짐 케이 / 홍한별 (0) | 2016.12.08 |
|---|---|
| 뉴미디어 아트와 게임 예술 / 유원준 / p.7 - p.8 (0) | 2016.11.17 |
| 개인주의자 선언 / 문유석 (2) | 2016.09.27 |
| 내 이름은 아무도안. 내 가족도 내 친구들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안이라고 부르지 / 강은경 (0) | 2016.09.24 |
|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 사사키 후미오 (0) | 201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