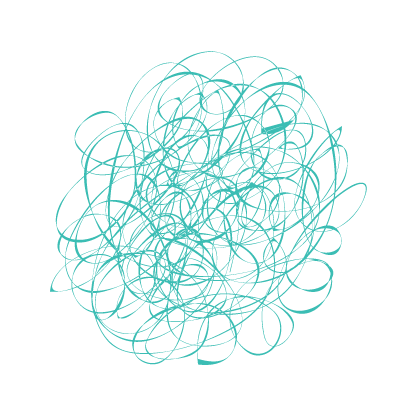"책상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것들은 먼 곳에서 뿌리 뽑혀 이곳에 왔고 원래 모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형태와 기능 속에 강제로 앉혀져 있다. 그것들은 긴 침묵 속에서 사물로서의 새로운 삶, 또는 새로운 죽음에 적응한다. 우리는 사물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그들의 체념과 그리움과 원한을 기억해야 한다. 사물들에게도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여백을 남겨주어야 한다."
- <아홉 마리 금붕어와 먼 곳의 물(안규철)> 중, '사물을 위한 여백', p.37
가끔은 책이 나를 부를 때가 있다. 전혀 다른 책을 찾아들어간 서가를 걸어나오는데 오른쪽 아래편으로 시선을 끄는 책등이 있었다. 짙은 회색 바탕에 영문으로 이름만 검정 글씨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해야 맞지만, 어쨌든 그것이 눈길을 잡아끈 것은 사실이다. 이 이름을 어디서 보았더라, 책을 꺼내고 앞쪽에 있는 제목을 보고서야 기억났다. 그리고 주저없이 책을 빌렸다. 잊히지 않는 구절이 너무나 많다, 다시 펼쳐도 새로운 페이지가 너무나 많다. 특히 '의자의 안부'를 읽으며 마음이 저렸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한다.
'동네디자이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트랜스포머 - 아이소타이프 도표를 만드는 원리 / 마리 노이라트, 로빈 킨로스 지음, 최슬기 옮김 / p.7 (0) | 2015.12.17 |
|---|---|
| 저스트 키즈 / 패티 스미스, 박소울 옮김 / p.278 (0) | 2015.12.11 |
| 책 읽는 요정 크니기 / 벤야민 좀머할더, 루시드 폴 옮김 (0) | 2015.12.02 |
| 떠나기 전 마지막 입맞춤 / 대니 그레고리 / p.89 (0) | 2015.11.29 |
| 손님을 싫어함('그늘에 대하여' 중) / 다니자키 준이치로 / p.144 - p.145 , p.151 - p.153 (0) | 2015.11.28 |